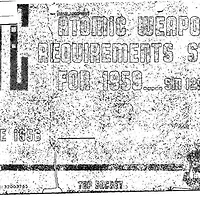같은 ‘대통령 명예훼손’이지만 산케이는 무죄, 둥글이는 유죄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24 06:35:16

최근 박근혜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잇달아 주목을 받았다. 하나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윤회씨가 만났다는 의혹을 소개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에 대한 판결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박근혜 풍자‧비판 전단지를 배포한 ‘둥글이’ 박성수씨에 대한 판결이었다.
판결의 근거가 된 두 사람의 ‘공소사실’에 등장한 의혹과 검찰의 판단은 동일하다.
카토 전 지국장의 공소사실은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낮 7시간 동안 대통령의 소재를 알 수 없다. 박 대통령은 ‘불통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소문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소문 중 대표적인 예는 OO일보 칼럼이다. 그 주요 내용은 정윤회씨와 모처에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박성수씨의 ‘공소사실’ 역시 “‘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박근혜와 정모씨는 어떤 관계인가’, ‘세월호 사고 당시 사라진 7시간을 왜 못 밝히냐’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주문 제작했다”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적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공통적으로 “대통령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드러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무죄를, 박씨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결정적으로 두 사건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했던 것일까?
‘대통령’이라는 최고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가늠하는 핵심 법리적 기준은 피해의 주체가 대통령으로서의 ‘공인’인지, 인격을 보유하고 명예의 주체가 되는 ‘사인’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두 사건에 대해 법원은 “‘사인’으로서의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동일하게 판단했다. 또 두 사건 재판부는 모두 “국가기관인 대통령이 인격권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명예훼손 판단의 또 다른 고려 지점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느냐’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두 사건 모두 ‘비방 목적’을 명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에 대한 판단을 받았다. 두 재판의 판단이 달라진 대목은 이 지점이다.
가토 전 지국장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소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기사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정치 상황의 중심 대상은 세월호 침몰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어떤 남성과 남녀관계라는 소문이 있는 대한민국의 일반적 여성 ‘개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인으로서의 대통령에 더 무게를 실은 것이다.
나아가 재판부는 “일본인인 피고인의 기사 작성 목적은 최인접 국가의 정치‧사회‧경제적 관심 사안을 본국인 일본 내지 일본인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박성수씨 재판의 경우엔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허위사실 적시 내용만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여성 대통령을 조롱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함으로써 그를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만이 드러날 뿐”이라고 봤다.
두 판결만을 비교해봤을 때 가토 전 지국장의 재판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엄격하면서도 꼼꼼하게 고려됐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박씨의 재판에서는 명예훼손 피해 주체에 대한 판단만 동일했을 뿐, 나머지 요소들에 대한 고려는 미흡했다. 특히 박씨가 제작‧배포한 전단의 ‘비방의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시 정치‧사회적 상황과 대통령에 대한 각종 의혹과 비판 등에서 비롯된 ‘맥락’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사법부는 본질이 같은 두 사건을 놓고 피고인의 신분에 따라 엇갈린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분명 ‘재갈 물리기 판결’이라는 비판을 넘어 판결의 공정성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대목이다. 특히 “일본인인 피고인의 기사 작성 목적은 최인접 국가의 정치‧사회‧경제적 관심 사안을 본국인 일본 내지 일본인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양형이유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회에서 산케이신문의 보도를 일본 내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검찰과 사법부가 말하는 ‘명예훼손’이라는 것의 피해 정도와 범위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가토 전 지국장에게 더 중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상식적이다. 수백만의 독자를 거느린 주류 신문사 보도가 갖는 권위와 기껏해야 몇만장에 불과한 비판 전단지가 갖는 무게감의 차이는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크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엄밀하게 봤을 때 피고인의 의무와 능력, 행위에 의해 피해를 줬을 양과 범위 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산케이 쪽이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다”며 “그럼에도 본질적인 측면은 크게 다를 게 없는 사안을 다르게 평가한 부분은 분명히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차별적인 대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어쩌면 이 두가지 판결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복잡한 법 논리가 아닐 지도 모른다. 그저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즉 강한 자에게는 관대하고 약한 자에게는 가혹하다는 일반의 통념이 더 좋은 설명처럼 보인다.
출처 같은 ‘대통령 명예훼손’이지만 산케이는 무죄, 둥글이는 유죄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24 06:35:16

▲ ‘둥글이’ 박성수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뿌려진 전단지에 대한 경찰 수사에 항의해 더 자세한 내용으로 박근혜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 촉구, 공안정국 조성 비판 하는 전단지를 제작 군산에서 배포했다. ⓒ‘둥글이’ 박성수씨 페이스북
최근 박근혜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잇달아 주목을 받았다. 하나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윤회씨가 만났다는 의혹을 소개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에 대한 판결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박근혜 풍자‧비판 전단지를 배포한 ‘둥글이’ 박성수씨에 대한 판결이었다.
판결의 근거가 된 두 사람의 ‘공소사실’에 등장한 의혹과 검찰의 판단은 동일하다.
카토 전 지국장의 공소사실은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낮 7시간 동안 대통령의 소재를 알 수 없다. 박 대통령은 ‘불통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소문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소문 중 대표적인 예는 OO일보 칼럼이다. 그 주요 내용은 정윤회씨와 모처에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박성수씨의 ‘공소사실’ 역시 “‘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박근혜와 정모씨는 어떤 관계인가’, ‘세월호 사고 당시 사라진 7시간을 왜 못 밝히냐’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주문 제작했다”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적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공통적으로 “대통령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드러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무죄를, 박씨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결정적으로 두 사건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했던 것일까?
공인으로서의 대통령은 명예훼손 대상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최고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가늠하는 핵심 법리적 기준은 피해의 주체가 대통령으로서의 ‘공인’인지, 인격을 보유하고 명예의 주체가 되는 ‘사인’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두 사건에 대해 법원은 “‘사인’으로서의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동일하게 판단했다. 또 두 사건 재판부는 모두 “국가기관인 대통령이 인격권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명예훼손 판단의 또 다른 고려 지점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느냐’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두 사건 모두 ‘비방 목적’을 명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에 대한 판단을 받았다. 두 재판의 판단이 달라진 대목은 이 지점이다.
가토 전 지국장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소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기사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정치 상황의 중심 대상은 세월호 침몰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어떤 남성과 남녀관계라는 소문이 있는 대한민국의 일반적 여성 ‘개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인으로서의 대통령에 더 무게를 실은 것이다.
나아가 재판부는 “일본인인 피고인의 기사 작성 목적은 최인접 국가의 정치‧사회‧경제적 관심 사안을 본국인 일본 내지 일본인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박성수씨 재판의 경우엔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허위사실 적시 내용만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여성 대통령을 조롱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함으로써 그를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만이 드러날 뿐”이라고 봤다.
두 판결만을 비교해봤을 때 가토 전 지국장의 재판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엄격하면서도 꼼꼼하게 고려됐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박씨의 재판에서는 명예훼손 피해 주체에 대한 판단만 동일했을 뿐, 나머지 요소들에 대한 고려는 미흡했다. 특히 박씨가 제작‧배포한 전단의 ‘비방의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시 정치‧사회적 상황과 대통령에 대한 각종 의혹과 비판 등에서 비롯된 ‘맥락’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사법부는 본질이 같은 두 사건을 놓고 피고인의 신분에 따라 엇갈린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분명 ‘재갈 물리기 판결’이라는 비판을 넘어 판결의 공정성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대목이다. 특히 “일본인인 피고인의 기사 작성 목적은 최인접 국가의 정치‧사회‧경제적 관심 사안을 본국인 일본 내지 일본인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양형이유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회에서 산케이신문의 보도를 일본 내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검찰과 사법부가 말하는 ‘명예훼손’이라는 것의 피해 정도와 범위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가토 전 지국장에게 더 중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상식적이다. 수백만의 독자를 거느린 주류 신문사 보도가 갖는 권위와 기껏해야 몇만장에 불과한 비판 전단지가 갖는 무게감의 차이는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크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엄밀하게 봤을 때 피고인의 의무와 능력, 행위에 의해 피해를 줬을 양과 범위 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산케이 쪽이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다”며 “그럼에도 본질적인 측면은 크게 다를 게 없는 사안을 다르게 평가한 부분은 분명히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차별적인 대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어쩌면 이 두가지 판결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복잡한 법 논리가 아닐 지도 모른다. 그저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즉 강한 자에게는 관대하고 약한 자에게는 가혹하다는 일반의 통념이 더 좋은 설명처럼 보인다.
출처 같은 ‘대통령 명예훼손’이지만 산케이는 무죄, 둥글이는 유죄
'세상에 이럴수가 > 정치·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시민사회단체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공개하라” 소송 제기 (0) | 2015.12.27 |
|---|---|
| 섬뜩한 ‘美 핵공격 계획’ 비밀해제... 민간인 대상 ‘초토화 전략’까지 (0) | 2015.12.27 |
| 표창원, 세월호특조위 자문위원에 위촉…“마음이 많이 무겁다” (0) | 2015.12.27 |
| 전무후무한 정당해산 결정, 그 뒷이야기 (0) | 2015.12.27 |
| 민중총궐기 과잉 진압·수사 책임자들 승진 (0) | 2015.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