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늘리려면 ‘작업’해야 한다”
[표지이야기]
[기획연재 ‘병원 OTL - 의료상업화 보고서’ ① 과잉 진료 권하는 병원]
한 사립대 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고발하는 과잉 진료
“수술 필요 없는 사람 몸 건드려, 낭비”
[한겨레] 김기태 기자 | 등록 : 2012.05.05 13:05 | 수정 : 2012.05.05 16:58
그는 익명을 요구했다. 인터뷰 내용이 워낙 민감했다. 수도권 사립대 병원의 한 정형외과 교수는 척추 수술이 폭증하는 상황을 10년 넘게 관찰한 내부자였다.
척추 수술이 크게 늘고 있다.
배경을 봐야 한다. 교과서대로 보면, 통증을 가진 환자라도 90~95%는 약물치료나 보존적인 치료로 낫는다. 의사의 처지에서는 그게 잘 치료하는 거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잘 치료할수록 수익이 적다는 점이다. 수익을 늘리려면 되도록 많은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초음파도 찍는다. 대부분의 환자는 초기 단계에서 검사가 필요 없다. 대략 90%의 질환은 엑스레이만 찍고 진찰 소견 사항만 가지고 진단할 수 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물론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도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병원 처지에서는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스탠더드한 방식을 쓰면 수익이 적다.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는 부재료를 쓰는 식으로 해서 비급여로 수익을 올려야 한다. 이 내용이 환자들에게 충분히,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
환자들로서는 이런 사정을 모를 수밖에 없다.
의료 영역은 대표적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정보가 비대칭적이다. 그래서 공급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환자의 판단을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병을 가진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한 명은 보존적 치료를 하는 병원에 가고, 나머지 한 명은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에 간다. 앞사람은 30만원을 내고, 뒷사람은 1천만원을 낸다. 그리고 두 사람이 완쾌해서 마주쳤다고 치자. 돈을 많이 내고 수술받은 사람이 억울하다고 생각할까? 아니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병을 앓은 것이다. 30만원을 낸 사람은 스스로가 그 정도 내야 나을 수 있는 병을 앓았다고 생각한다. 1천만원을 낸 사람도 자신이 더 중병을 앓았다고 생각한다. 환자가 불필요하게 돈을 더 내게 하는 곳은 좋은 병원이 아니다. 굳이 수술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의 몸을 건드려서 오히려 건강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낭비다.
현재 척추 수술 ‘시장’의 현황을 평가해달라.
지나치게 상업화한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비춰 비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살고 있다. 정부에서도 영리법인을 도입한다고 하지 않나. 의료계에서도 영리성이 점점 강조된다. 그런 상황에서 의사들은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무리하게 상업화한 병원들이 이미 상업적 성공의 롤모델이 됐다. 많은 병원들이 그런 방식을 따라가고 있다.
문제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는가.
어렵다. 총체적인 문제다. 구체적인 안을 한 가지만 꼽으면,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의사의 치료 횟수에 따라 한 건씩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에서는 불필요한 검사나 시술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다.
출처 : “수익 늘리려면 ‘작업’해야 한다”
[표지이야기]
[기획연재 ‘병원 OTL - 의료상업화 보고서’ ① 과잉 진료 권하는 병원]
한 사립대 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고발하는 과잉 진료
“수술 필요 없는 사람 몸 건드려, 낭비”
[한겨레] 김기태 기자 | 등록 : 2012.05.05 13:05 | 수정 : 2012.05.05 16: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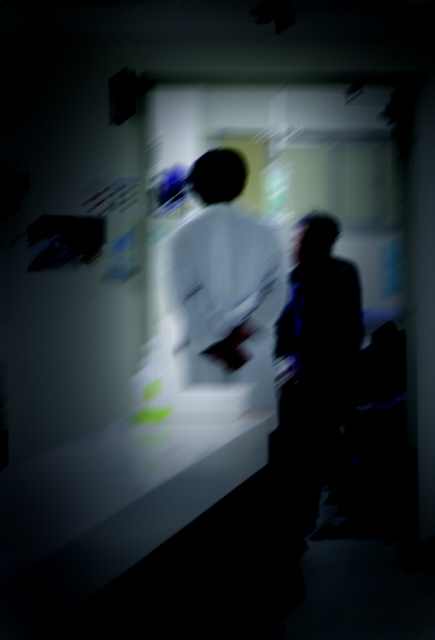 |
그는 익명을 요구했다. 인터뷰 내용이 워낙 민감했다. 수도권 사립대 병원의 한 정형외과 교수는 척추 수술이 폭증하는 상황을 10년 넘게 관찰한 내부자였다.
척추 수술이 크게 늘고 있다.
배경을 봐야 한다. 교과서대로 보면, 통증을 가진 환자라도 90~95%는 약물치료나 보존적인 치료로 낫는다. 의사의 처지에서는 그게 잘 치료하는 거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잘 치료할수록 수익이 적다는 점이다. 수익을 늘리려면 되도록 많은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초음파도 찍는다. 대부분의 환자는 초기 단계에서 검사가 필요 없다. 대략 90%의 질환은 엑스레이만 찍고 진찰 소견 사항만 가지고 진단할 수 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물론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도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병원 처지에서는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스탠더드한 방식을 쓰면 수익이 적다.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는 부재료를 쓰는 식으로 해서 비급여로 수익을 올려야 한다. 이 내용이 환자들에게 충분히,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
환자들로서는 이런 사정을 모를 수밖에 없다.
의료 영역은 대표적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정보가 비대칭적이다. 그래서 공급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환자의 판단을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병을 가진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한 명은 보존적 치료를 하는 병원에 가고, 나머지 한 명은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에 간다. 앞사람은 30만원을 내고, 뒷사람은 1천만원을 낸다. 그리고 두 사람이 완쾌해서 마주쳤다고 치자. 돈을 많이 내고 수술받은 사람이 억울하다고 생각할까? 아니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병을 앓은 것이다. 30만원을 낸 사람은 스스로가 그 정도 내야 나을 수 있는 병을 앓았다고 생각한다. 1천만원을 낸 사람도 자신이 더 중병을 앓았다고 생각한다. 환자가 불필요하게 돈을 더 내게 하는 곳은 좋은 병원이 아니다. 굳이 수술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의 몸을 건드려서 오히려 건강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낭비다.
현재 척추 수술 ‘시장’의 현황을 평가해달라.
지나치게 상업화한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비춰 비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살고 있다. 정부에서도 영리법인을 도입한다고 하지 않나. 의료계에서도 영리성이 점점 강조된다. 그런 상황에서 의사들은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무리하게 상업화한 병원들이 이미 상업적 성공의 롤모델이 됐다. 많은 병원들이 그런 방식을 따라가고 있다.
문제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는가.
어렵다. 총체적인 문제다. 구체적인 안을 한 가지만 꼽으면,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의사의 치료 횟수에 따라 한 건씩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에서는 불필요한 검사나 시술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다.
출처 : “수익 늘리려면 ‘작업’해야 한다”
'세상에 이럴수가 > 의료 민영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업 의사` 말대로면 한국 병원 70%가 저질 (0) | 2012.06.14 |
|---|---|
| [한겨레21] 의료상업화 보고서 ① 환자 체험 갔다가 하마터면 치질 수술 받을 뻔한 사연 (0) | 2012.05.06 |
| [한겨레21] 의료상업화 보고서 ① 병원 상업화, MRI를 찍어보다 (0) | 2012.05.06 |
| 미국시민권자입니다-하루입원비 1200만원입니다! (0) | 2012.01.13 |
| `건강보험 해체론자가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 (0) | 2011.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