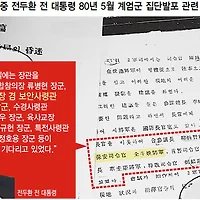박근혜의 메르스병동 ‘살려야 한다’, 연출 맞다
의료진이 한 환자 명패에 붙인 것
박근혜 병원 방문 직전에
청와대 직원 다녀간뒤 곳곳 도배
간호사들 “정부 책임 다하라”
[한겨레]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최혜정 기자 | 등록 :2016-05-16 16:54수정 :2016-05-16 22:19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 14일 박근혜가 서울대병원을 방문했을 때 감염병동 간호사실 벽 곳곳에는 ‘살려야 한다’는 문구가 쓰인 에이(A)4 용지가 붙어 있었다. 특히 신문들에 보도된, 박근혜가 간호사실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며 의료진과 통화하는 사진에는 컴퓨터 모니터 옆 벽에 붙어있는 이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다. 방송사 카메라에 이 문구 용지가 곳곳에 붙어 있는 것이 잡히면서 ‘연출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다. 이에 당시 서울대병원 쪽은 “메르스 환자들이 입원할 때부터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붙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이 문구는 박근혜가 방문하기 직전 청와대 관계자들이 병원을 미리 방문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실 여러 곳에 붙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에는 격리병실에 입원한 한 메르스 환자의 명패 위에 담당 의사가 개인적으로 붙여 놓은 것이었다.
당시 감염병동에서 메르스 환자를 간호했던 서울대병원의 한 간호사는 16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살려야 한다’는 문구는 감염내과 전임의(펠로우) 선생님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 메르스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중증 환자의 명패 위에 붙여 놓은 것이었다. 박근혜가 방문하기 직전에 청와대 직원들이 병원을 돌아보면서 이 문구를 봤고, 그들 중 누군가의 말에 따라 여러 장 복사해 간호사실 곳곳에 붙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간호사는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방문 현장에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애초 환자 명패 위에 있던 것을 대통령 방문 직전에 여러 곳에 붙인 것은 맞다. 하지만 청와대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병원 쪽에서 자체 판단으로 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쪽이 왔을 때 병원 쪽에서 그 문구가 서울대병원의 치료 의지를 보여줄 기회라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그것을 붙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병원이야 홍보가 되니까 붙였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살려야 한다’는 문구는 방송과 신문 지면에 많이 노출됐지만, 정작 간호사들이 보여주고자 했던 (세월호를 상징하는)‘노란 리본’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감염병동에서 메르스 환자를 간호했던 또 다른 간호사인 최은영 서울대병원 간호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많은 간호사가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유행이 ‘국가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박근혜에게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유행에 대해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청하는 의미로 노란 리본을 달았다. 나중에 나온 사진을 보니 노란 리본은 보이지 않고 ‘살려야 한다’는 문구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 두 간호사는 메르스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서울대병원 감염병동에서 일하면서 14번째 환자(이른바 메르스 ‘슈퍼전파자’), 국내 마지막 메르스 환자 등을 간호했다.
출처 [단독] 박근혜의 메르스병동 ‘살려야 한다’, 연출 맞다
의료진이 한 환자 명패에 붙인 것
박근혜 병원 방문 직전에
청와대 직원 다녀간뒤 곳곳 도배
간호사들 “정부 책임 다하라”
[한겨레]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최혜정 기자 | 등록 :2016-05-16 16:54수정 :2016-05-16 22:19

▲ 박근혜가 지난해 6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 메르스환자 치료병원을 찾아 격리병동 상황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의료진과 통화를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 14일 박근혜가 서울대병원을 방문했을 때 감염병동 간호사실 벽 곳곳에는 ‘살려야 한다’는 문구가 쓰인 에이(A)4 용지가 붙어 있었다. 특히 신문들에 보도된, 박근혜가 간호사실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며 의료진과 통화하는 사진에는 컴퓨터 모니터 옆 벽에 붙어있는 이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다. 방송사 카메라에 이 문구 용지가 곳곳에 붙어 있는 것이 잡히면서 ‘연출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다. 이에 당시 서울대병원 쪽은 “메르스 환자들이 입원할 때부터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붙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이 문구는 박근혜가 방문하기 직전 청와대 관계자들이 병원을 미리 방문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실 여러 곳에 붙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에는 격리병실에 입원한 한 메르스 환자의 명패 위에 담당 의사가 개인적으로 붙여 놓은 것이었다.
당시 감염병동에서 메르스 환자를 간호했던 서울대병원의 한 간호사는 16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살려야 한다’는 문구는 감염내과 전임의(펠로우) 선생님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 메르스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중증 환자의 명패 위에 붙여 놓은 것이었다. 박근혜가 방문하기 직전에 청와대 직원들이 병원을 돌아보면서 이 문구를 봤고, 그들 중 누군가의 말에 따라 여러 장 복사해 간호사실 곳곳에 붙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간호사는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방문 현장에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애초 환자 명패 위에 있던 것을 대통령 방문 직전에 여러 곳에 붙인 것은 맞다. 하지만 청와대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병원 쪽에서 자체 판단으로 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쪽이 왔을 때 병원 쪽에서 그 문구가 서울대병원의 치료 의지를 보여줄 기회라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그것을 붙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병원이야 홍보가 되니까 붙였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살려야 한다’는 문구는 방송과 신문 지면에 많이 노출됐지만, 정작 간호사들이 보여주고자 했던 (세월호를 상징하는)‘노란 리본’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감염병동에서 메르스 환자를 간호했던 또 다른 간호사인 최은영 서울대병원 간호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많은 간호사가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유행이 ‘국가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박근혜에게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유행에 대해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청하는 의미로 노란 리본을 달았다. 나중에 나온 사진을 보니 노란 리본은 보이지 않고 ‘살려야 한다’는 문구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 두 간호사는 메르스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서울대병원 감염병동에서 일하면서 14번째 환자(이른바 메르스 ‘슈퍼전파자’), 국내 마지막 메르스 환자 등을 간호했다.
출처 [단독] 박근혜의 메르스병동 ‘살려야 한다’, 연출 맞다
'세상에 이럴수가 > 정치·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어버이연합게이트 지금까지 드러난 돈 흐름 빙산의 일각” (0) | 2016.05.22 |
|---|---|
| ‘임을 위한 행진곡’은 어떤 노래인가? (0) | 2016.05.18 |
| 전두환 ‘긴급발포’ 2시간전 회의 참석 (0) | 2016.05.18 |
| 노무현 잡고 함박웃음 짓던 ‘정치검찰’ 홍만표를 기억하다 (0) | 2016.05.18 |
| 김제동 “오월의 광주에게 깊이 두손을 모읍니다” (0) | 2016.05.18 |